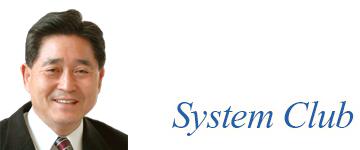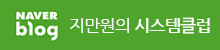표절 없는 논문, 한국엔 드물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4-02 11:46 조회12,05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표절 없는 논문, 한국엔 드물 것
오늘 (4.2) 아침 조선일보에 김형기 논설위원이 “학자 될 것 아닌데 왜 논문 강요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제목이 이상하여 읽어보았더니 이렇게 시작됐다.
“스타 강사 김미경씨가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기사가 나간 날 한 독자가 신문사를 찾아왔다. 그는 비닐봉지에 달걀 120개를 싸들고 왔다. 항의 표시로 신문사 간판에 던질 작정이었다고 한다. 그는 달걀 투척은 포기했지만 이런 말을 남기고 갔다. 김미경씨는 세상을 밝게 해주는 사람이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박사 학위도 아니고 석사 논문 아닌가. 조선일보에도 석사·박사 많을 텐데 모두 완벽한지 궁금하다."
김미화와 김혜수와 같은 연예인은 물론 대학총장, 교장, 장관들까지 다 표절에 걸려 체면들을 구겼다. 필자는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공대 등에서 코피를 늘 흘릴 정도로 스파르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쓰는 논문은 오리지낼러티(자기 창작)가 있겠지만 그 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야간에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논문을 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왔다.
필자는 홍릉 연구소에 있을 때 서울대, 고대, 경희대, 동국대, 성대, 단국대, 인하대, 한양대 등에 나가 응용수학, MIS 등을 강의했고, 석사와 박사 논문도 심사했다. 이런 경험과 경력에 근거하여 필자는 대부분의 초일류급이 아닌 대학에서 부업하듯이 석사과정을 이수하는 직장인들에 진정한 의미의 논문을 쓰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한다.
논문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기가 석사과정에서 배운 실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문제를 찾아내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푸는 것을 말한다. 배운 게 있어야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배운 게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야간에 그것도 결석하는 날이 더 많은 식으로 교실에 나타나는 식으로 쌓은 학문의 깊이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내공 자체가 없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어디서 그럴듯하게 베껴오라는 팬토마임(무언극)일 것이다.
필자는 미국에서 가장 잔인하다는 악명 나 있는 미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괴정을 밟으면서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잔 것 같다. 2-3시에 잠을 청해 7시에 깨어나려면 자신도 모르게 ‘어구 어구’ 소리가 절로 났다. 이웃 친구들과 대화 한번 나눌 수 없을 만큼 각박하게 시간에 쫓겼다, 논문을 써야 하는데 도대체 문제를 찾아낸다는 것이 너무 막연했다.
어느 날 교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필자는 문제를 찾아냈다. 결국 제조기업이 운용하는 내부통제시스템(internal controtol system)을 전제로 할 때 기업의 연말 제공품(WORK IN PROCESS)의 가치를 3개월 동안의 샘플 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수학적 감사기법’(mathematical models for evaluating internal control system)을 개발하기로 했다. 필자의 교수님(Burns)은 이를 시뮬레이션으로 개발하여 DBA를 땄지만 필자는 석사과정에서 시뮬레이션 대신 딱 떨어지는 수학공식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다.
이에 감동한 교수(Burns)는 필자를 문과석사에서 이과박사로 강력히 추천했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적거리는 학교 당국에 “이 학생을 이과에서 안 받아주면 내가 학교를 떠나겠다‘고 협박하여 1907년 학교 창설 이래 최초로 문과에서 이과로 분야를 옮겼다. 모든 시험에 합격하고도 박사논문에서 무슨 문제를 잡을까 또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런데 마침 3인의 교수들이 공동하여 문제는 만들어 놓고도 풀지 못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었다. 필자는 그 문제를 푸는데 성공했다. 요는 논문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다.
필자의 박사논문에는 2개의 공식과 6개의 정리 그리고 1개의 스페어 파트 계산를 위한 알고리즘이 들어있다. 여러 개의 비교 매트릭스에서 아이겐밸류를 찾아내 매트릭스의 크기를 비교하고, Laplas Transformation, Renewal Theorem 등을 총 망라하여 새로운 공식을 만들고, 정리를 만들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여 수십만개에 달하는 미국 군함의 항해기간 90일 치에 해당하는 수리부품 적재수량을 계산하게 해주었다. 담임 교수가 졸업식에서 이 업적을 소개하자 장내에는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지금도 그 고장에 가면 필자는 전설의 인물(legendary person)로 회자되고 있다 한다.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영감을 얻어 문제를 푸는 것이 공부요 논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카이스트의 서남표 총장의 스파르타식 드라이브에 박수를 보냈던 것이다.
필자가 겪은 과정이 이러하고, 필자가 한국 대학들에 강의를 나가면서 겪은 경험들이 있기에 필자는 한국의 야간대학원을 다녀가지고서는 정당한 논문을 쓸 수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다. ‘만일 전수조사를 한다면 한국사회에서 오리지낼러티가 있는 논문이 과연 있기나 할까?’ 이것이 솔직한 필자의 생각이다.
아래는 필자의 논문의 성격을 나타내는 수학기호들의 언어다.

| . |
 
|
아래는 미해군의 한 석사과정 학생이 필자의 공식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기존의 미해군이 가지고 있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박하는 논문을 쓴 사례다.


| . |

| . |
2013.4.2.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