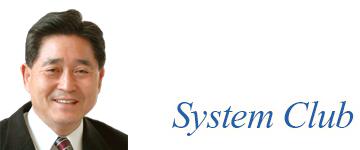내가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출입하고 있던 63년 8월 29일은 박정희 의장이 민정참여를 위해 지포리에서 전역(예편)하기 하루 전날이었다.
이후락 공보실장이 나에게 전화로 만나자고 했다.
이 실장은 놀랍게도 박 의장이 다음날 읽을 전역사를 나에게 내놓았다.
연설문을 읽어보고 그날 저녁에 박 의장에게 스피치 레슨(?)을 해주라는 주문이었다.
나는 연설문만으로도 특종인데 박 의장과 독대를 주선해 주겠다니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전역사에는 “다시는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역사적인 문장이 들어 있었다.
연설문을 읽어본 다음 이 실장과 나는 곧장 장충동에 있는 최고회의 의장 공관으로 달려갔다.
얼마후 박 의장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이 실장은 나를 박 의장에게 소개하고 오늘 나와 동행한 이유를 설명했다.
가까이에서 본 박 의장은 검소하고 인간적이었다.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은 낡은 바지, 농부들이 농사철에나 입음직한 남방셔츠에 왕골 슬리퍼를 신은 박 의장의 복장은 소박한 시골 아저씨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박 의장의 광채가 번뜩이는 눈매는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
연설문을 한번 읽어보라는 이 실장의 말에 박 의장은 “내일 읽어보지”하고는 “이 기자도 왔으니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다.
술이 나오자 박 의장은 감회어린 눈으로 벽 쪽을 가리키며 “이 기자, 저 군복이 내일 마지막으로 입을 옷이야”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이 몇 순배 돌면서 박 의장은 영욕으로 점철된 군생활을 회고한 다음 민주공화당 창당, 경제개발 청사진, 새마을운동에 대한 기본구상 등 그의 통치철학이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술에 취해 거의 인사불성이면서도 박 의장의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 속으로 메모해 나갔다.
시간은 어느덧 통금시간을 지나 새벽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 실장의 건의로 겨우 술자리를 끝내고 나는 경호실 차를 타고 신문사로 돌아왔다.
나는 그날의 면담 내용을 이 실장과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조건으로 굳게 약속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내용만 골라 작은 박스기사를 썼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생각해 보아도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비전과 선견, 강력한 지도력, 청렴, 그리고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신념을 심어주고 가난에서 해방시킨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지도자의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