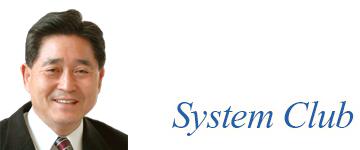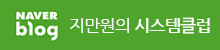문화재청에 정식 민원 신청한 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육군예비역병장 작성일11-01-10 01:42 조회1,8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바야흐로 21세기는 '다양성'과 '다원화'의 시대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문정책은 시대 정신을 거스러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로 정(定)하고 있다. 본인이 보기에 그것은 전체주의적 태도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규격화된 공산품 찍어내듯이 획일화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방언(方言, 사투리)이 심하면 서로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이 비효율적일 수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의 특색있는 고유한 방언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할 것이다.
지역 마다의 민담, 전설 그리고 토속적(ethnic)인 문학 작품 속에서 향과 맛을 살리는 구수한 방언은 그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지방 무형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차기 대선 유력 후보 정치인이 방언을 사용하여 모임 참석자들을 웃길 수 있었던 것은 표준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하고 방언이 아니면 아니 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그러한 예(例)만 보더라도 지역 방언은 값어치가 있다.
이제 발상을 전환할 때다. 표준어를 기준으로 방언을 홀대할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일종의 문화상대주의적 견지에서 표준어는 '서울 지역 방언'으로 보는 것이다. 즉, 기존의 표준어 일원화을 지양하여, 각 지역의 고유 특색을 지니는 방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준화와 동등한 위치를 점하도록 하는 다원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의사 소통 상의 혼란을 초래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 말글살이를 보다 더 다채롭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한국어에 있어서 하나의 보고(寶庫)가 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그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자면, 지역 방언을 '지방 무형문화재'로 등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방언을 가르치는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본인이 과목명까지 구체적으로 명명해서 제안하는데, '향토 문화'라는 과목명이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 '향토 문화' 과목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택과목으로서 지역의 지리, 환경, 역사, 토속어, 전통 생활을 개략적으로나마 포괄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전통 생활에는 지역 고유의 건축 양식이나 음식, 농기구, 생활 도구 그리고 민속 놀이까지 골고루 다루어서 각 지역의 개성을 계승하고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다양성과 창조성이라는 국가 저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토 문화' 교과 내용은 책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말이면 지역 문화재, 민속 박물관을 찾고 지역 고유의 민속 놀이를 체험하고, 전래동요를 부르면서 생활로 연결되어야 한다. 요즈음 아동, 청소년들 중 몇 명이나 베틀, 맷돌, 삼태기, 둥구미(짚으로 엮은 수납 도구), 키, 가마솥, 떡메, 쇠코뚜레, 지게를 직접 만져 보고 써 본 적이 있을까. 잿빛 콘크리트 도시의 '아스팔트 킨트'로 자란 아동 청소년의 정서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효석의 단편 소설 '메밀꽃 필 무렵'나 정지용의 시, '향수鄕愁'가 과연 절절하게 와 닿을까?
투박한 방언을 위시하여 지역 문화에 '한민족의 얼'이 스며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그러한 향토 문화의 국가 정책 차원의 활성화와 계승을 통해 한국 문화의 다원화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역동적인 국가 문화, 경제 발전의 저력이 될 것이다.
경북 동해안 고래불에서 은둔하는 와룡 정선규 제언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