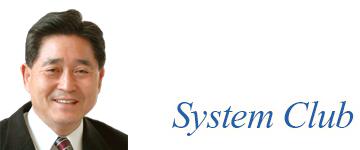내가 겪은 6.25(7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찬수 작성일10-11-29 05:37 조회2,063회 댓글3건관련링크
본문
64. 판잣집 철거 수난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오니 온 동네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며칠전 부터 어른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자고 하면서 밤낮으로 회의를 하였었다. 회의의 내용은 우리 동네가 병설중학교 사정으로 모든 집을 철거하고 땅을 내어놓아야 될 형편이란 것이다. 우리 동네 판자촌의 자리는 사범 병설중학교 땅이라 하였다. 그러나 피난민이 당장 대책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시 당국에서 피난민이 옮겨갈 자리를 마련해 주고 서서히 철거하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여 시청에다가 진정을 하고 병설중학교 당국에 진정을 하고 난리가 났다.
당장 철거하라는데 그 많은 전쟁 피난민들이 어디로 일시에 옮겨가라는 말인지 그때의 나의 느낌은 이러하였다. ‘너희들의 집을 우격다짐으로라도 헐어 근거를 없애놓으면 아무 곳에 가서 비벼대고 살기 마련이다. 우리의 통치방법은 이런 방법밖엔 없다!’ 그런 식의 처사였던 것같이 느껴져 참으로 답답했다.
나는 이때의 상황을 하필이면 훗날 서울로 이사 와서 상황은 약간씩 다르겠으나 여기저기에서의 철거민의 애환과 정경들을 평생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도 목격하고 있다. 아미동 우리 마을 사람들은 사실상 대책이 없었다. 따지자면 이 마을 입주한 피난민들은 몰래 집을 지어 피난민들에게 돈 몇 푼 받고 잽싸게 팔고 종적을 감춘 집장사를 통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어떻게 행여나 잘되겠지 하고 날짜만 가는데 시청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5월 초 음력 윤달 3월 3일(곧 비가 올 듯이 흐림), 그날 시청의 철거반이 들이닥쳤다. 건장한 아저씨들이 작업복을 입고 손에 망치․해머․빠루 등을 들고 저 아래 동네에서부터 철거하면서 꼭대기로 치달았다. 판잣집이라 허깨비 같아서 한두 번 꽈 당당 하고 내리치고 흔들어 놓으면 잘도 쓰러져 갔다. 그러나 이것을 당하는 피난민들의 마음은 분노하고 슬프기만 하였다.
정다운 고향집을 다 내버리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38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과 남한에 살다가 난데없이 불법 남침한 김일성의 폭거를 피해 남으로 부산까지 살려고 온 사람들이 이 서러운 봉변을 당하니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었다. 집집마다 아우성이고 우리 또래의 청소년들은 집안의 가재도구를 끄집어내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철거반 아저씨들은 피난민 주민의 아우성엔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저 씩씩하게 무자비하게 내리 부수기만 하였다. 부수는 것이 신명이 나는지 키득거리면서 저들끼리 눈짓하면서 웃기 까지 하는데 나는 두렵기도 했지만 분노의 마음이 솟아올랐다. 여기저기서 집주인들과 철거반들의 싸움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살림살이나 밖으로 다 내놓은 다음에 부수지 이게 무슨 불한당 짓이냐 하면서 이웃집 할아버지가 호통을 쳤지만 철거반 아저씨들에게는 그런 말이 들릴 턱도 없고 들었다 해도 외면하고 무시할 뿐이었다.
큰 쇠망치를 높이 쳐들었다가 판잣집 나무기둥을 들이치면 꽈당당 하고 판잣집이 허깨비같이 여기저기서 주저앉았다. 아주머니 동네 누나 할머니들이 울며불며 통곡을 하였고 기가 센 아저씨들이 철거반원 아저씨들과 몸싸움도 하였다. 드디어 철거반이 우리 집 앞에 당도하였다. 온 식구들이 철거반 아저씨들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 사람이 곧 출산을 할 것 같은데 아이를 낳고 며칠간 말미를 주면 곧바로 자진 철거하겠다.”
하며 여러 차례나 간곡하게 사정사정을 하였다. 멈칫거리던 몇 사람 가운데 성질이 사납게 생긴 사람이 썩 나서면서,
“우리의 철거를 방해하면 곧바로 고발하고 경찰들이 붙들어가게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엄포를 놓았다. 그래도 아버지가 다시 사정하고 할머니와 만삭이 된 어머니까지 나서서 사정했지만 그들은 우리들을 밀치고 무자비하게 우리의 보금자리 6평밖에 되지 않는 판잣집을 삽시간에 우당탕 퉁탕 와지끈 하며 쓰러뜨려 부셔버렸다.
나는 너무도 분해 갑자기 철거반 아저씨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못해요! 못해요! 안돼요!”
하며 정신없이 달려들었다. 건장한 아저씨가
“이누마가 정신 나갔나? 니 죽고 싶나? 저리 안 비킬래?”
하면서 나의 멱살을 움켜잡고 밀쳤는데도 나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분을 삭일 수 없어 씩씩거리면서 대들었다. 열다섯 살 되던 해 봄 사춘기 때 내가 나의 집 재산과 가족들을 지키려고 외부사람에게 거세게 대항해 본 첫 번째 경험이었다.(계속)
댓글목록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우리집도 그렇게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참 옛날에 정말 무지막지 했죠.
무식하고 힘있는 몽치꾼 놈이 와서 해머로 몇대 쥐어갈기면 집이 무너지던 시절.
요즘처럼 좋은 철근콘크리트나 벽돌도 아니고 허술한 판자나 나무에 슬레이트나 약한 벽돌이었으니 더더욱.
어린 나이에 그렇게 당하고 나니 세상이 무서워지더라고요.
기린아님의 댓글
기린아 작성일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1편을 보게되었습니다.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여지껏 책 한권 공짜(?)로 읽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입시의 잔재(?)이후로 문학을 싫어하는 편인데,
김찬수님의 글은 매우 흥미진진하게 읽고있습니다.
6.25는 물론 대포소리 한 번 들어보지 모한 저에게는 매우 귀중한 글입니다.
화곡 김찬수님의 삶을 담은, 진실된 책! 인간 기억력의 결정체!
소중한 기록,감사드립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http://www.gayo114.com/p.asp?c=6780452928
손 로원 작사, 이 재호 작곡 박 재홍 님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