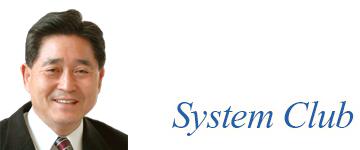내가 겪은 6.25(49)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찬수 작성일10-11-08 04:21 조회1,92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38. 피난민 집합지 거제도 연초면
연초 면에만 4만이 넘는 피난민들이 있었다 하니 좁은 마을의 정황이 어떠했는지를 상상하고도 남는다. 밤에 보니 주변 언덕과 높은 곳에 불빛이 휘황찬란하여, 개발하기 얼마 전의 서울 돈암동 산꼭대기의 판자촌 야경같이 높은 빌딩이 가득 들어서서 불을 켜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튿날, 건너다보니 산꼭대기부터 너무도 좁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판잣집들 천지였다. 연초면 들판도 빼곡히 다 판잣집 촌이었다. 연초면의 서쪽인 연사리에는 초가집들이 많았다. 간혹 기와집도 있었지만 이런 집은 모두 다 거제도 본토박이(원주민)들이 사는 곳이고 피난민들의 집은 가는 데마다 규모가 일정치 않은 판잣집 일색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날이 어두워 시장께 중앙극장이 있는 곳에 도착해 아버지를 따라 차에서 내리니 내 소문을 듣고 시장 통에 모인 연초면 피난민들이 웅성거리며 여기저기서 나를 구경하려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
“교장 선생님이 북에 두고 온 아들을 찾았다!”
“38 이북의 전쟁터에서 아들이 살아 내려왔단다!”
“전쟁 통 한가운데서 살아 왔다고?”
“이북에서?”
“전방에서 싸움하던 군인이 찾아서 데리고 내려왔대요!”
하고 외치면서 야단들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터에서 소문을 듣고 모두가 나를 찾아 다가왔다. 지금은 평범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 때는 예삿일이 아니었다. 온 연초면 피난민들의 피맺힌 한이 들끓기 시작하여 나에게 시선과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다.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누나, 형들이 나를 중심으로 이성을 잃은 것처럼 에워싸며 다가오는데 나는 그야말로 숨이 막혀 갑자기 압사를 당할 지경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만져 봄으로써 얼마 전에 이북 각처에서 급하게 피난할 때 남겨두고 온 사랑하는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심정을 느껴 보고자 함이었다.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만지고 등을 토닥여 주면서 어떤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나의 손을 잡고 통곡을 하고…….
소문을 듣고 우리 집 사정을 안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할 것 없이 무조건 나의 볼이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등을 토닥여 주면서 눈물을 흘렸으니 이처럼 슬프고 애처로운 장면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나를 집으로 먼저 데리고 오는 줄 알고 두 여동생과 기다리던 어머니는 내가 오지를 않아 중앙시장 쪽으로 달려오는 중이였다. 그런데 정작 아들을 제일 먼저 만나야 할 어머니는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참 뒤 사람들이 그제야,
“교장 선생님 사모님이 저기 오신다! 길을 비켜라!”
하면서 사람들이 갈라선 가운데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달려왔다. 어머니를 본 나는 가슴속 가득히 담고만 있던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내어 울면서,
“어머니!”
하고 울부짖으며 어머니 품에 안겼다.
“찬수야!”
“어머니!”
나와 어머니가 서로 부둥켜안고 한참 울다가 어머니가 조용하여 내려다보니 어머니는 실신하여 땅바닥에 쓰러졌다. 사람들이 어머니의 손과 발을 주무르고 더운 물을 입에 넣어 주고 손과 발을 씻기고 하는 북새통에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나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붙들고 또 통곡하면서,
“할머니는…… 할머니는?”
하고 물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나간 공산주의 학정과 공포의 세월, 전쟁의 한스러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어찌 이 울음으로 다 풀리랴! 기쁨의 통곡! 구경 나온 피난민들의 슬픔의 통곡! 부러움의 통곡! 무모하게 일으킨 6ㆍ25 전쟁의 쓰라린 흔적이 피난민의 한이 여기 한반도의 남단 거제도에 산더미보다 더 높게 쌓여 있었다.
늦게야 진정하신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는 쌀가게에서 걀쭉걀쭉한 알랑미(안남미)를 외상으로가
두 여동생은 낯이 설어 별 표정이 없이 멀거니 쳐다보기만 하다가 큰 여동생이 좀 컸다고 내게 다가와 쳐다보며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급히 저녁을 차려 들여오는데 두 여동생이 밥상 양옆에 착 달라붙어 내가 밥을 먹는 것을 쳐다봤다. 처음에는 의식 못했는데 내가 밥숟가락으로 밥을 뜨면 고개를 내려 떠지는 밥을 보고 입으로 숟가락을 올리면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것이었다. 내가 두 동생들에게 같이 먹자고 했더니 어머니가 “얘들은 먹었으니 너만 먹어라”고 했지만 동생들이 자꾸 걸려 고집을 부려 같이 먹었다.
이튿날, 나는 두 동생들이 왜 그러는지를 알았다. 놀랍게도 피난민 전체가 거의 굶으면서 생활했고 끼니때마다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는 억세고 껄끄러운 메수수만 삶은 걸 먹는 게 전부였다. 숟가락에 잘 담아지지도 않는 그런 밥이다. 중부전선 고향에서의 전쟁 통에서도 구경해 보지 못했던 그런 밥이었다. 동생들이 하얀 알랑미 쌀밥을 보고 밥상 옆에 바싹 다가앉아서 군침을 흘리고 숟가락이 오르내리는 것을 따라 고개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쳐다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틀 정도 식사 때마다 나의 밥만 하얗고 다른 식구들의 밥들은 새빨갛게 된 수수 삶은 것뿐이었다. 3일 뒤부터 나도 본격적으로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는 메수수 밥만 먹기 시작했다.(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