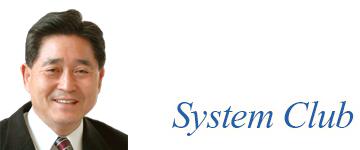내가 겪은 6.25(4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찬수 작성일10-11-06 05:40 조회2,02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36. 부산 거제리 병영의 하우스보이 생활
1952년 10월 초, 나는 권상사 아저씨의 지프차 뒷좌석에 타고 LST 수송전함에 올랐다. 어떻게 올라가나 하고 궁금했는데 지프차를 탄 채로 배 갑판 쪽에서 내리는 아주 넓은 판이 아래에 닿으니 그 철판 위로 차가 언덕으로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것이었다. 마음속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그 배 규모 전체가 놀라울 뿐이었다. 아침부터 몇 시간 동안 그 많은 군인들과 차량이 배 안으로 모두 다 들어간 것이다. 오후 늦게 그 큰 배는 “뿌우웅! 뿌우웅!” 소리를 몇 번 내더니만 항구를 떠났다.
배 안 침대에 있던 내가 권상사 아저씨의 허락을 받고 사다리를 한참 올라 갑판 위로 가 보았다. 배가 속초항을 떠났으니 할머니가 남아 있는 설악산 아래 송암산 근처나마 건너다보고자 함이었다. 배는 벌써 속초 앞바다 동해안 한가운데 들어 기운차게 남쪽으로 항해하였다.
사실 그때 나는 그 큰 배가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았다. 가끔 넓은 갑판 위에 고인 빗물이 좌우로 약간씩 흘러 쏠리는 것만 보였는데, 난간을 짚고 서서 문득 멀리 서쪽에 있는 태백산맥 쪽을 보니 설악산이나 송암산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종잡을 수 없었고 해가 넘어간 뒤의 높고 기다란 검은 태백산맥만이 장엄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런데도 다시 할머니가 남아 있는 송암산 아래 우리 마을이 위치한 곳을 가늠해 찾으려 했으니…… 아무리 찾아도 보일 리가 없는데 말이다. 마음속으로 고향에 남아 있는 할머니가 자꾸 보고 싶었다.
큰 배가 지나가니 거센 검푸른 물결만 산더미처럼 일어 허옇게 부서지는 바닷물살만 내려다보았다. 내 집 마을 위치도 찾지 못하고 갑판 아래 침실로 내려온 나는 이튿날 아침 배가 부산항에 도착할 때까지 긴장이 풀려서인지 정신없이 늘어지게 잤다. 부산항에 도착했다는 소리에 짐을 챙겨 권상사 아저씨를 따라 나가니 커다란 뱃고동 소리가 “뿌웅 뿌웅” 하며 온 항구를 울렸다.
다시 지프차를 타고 ‘아가리 배’에서 나와 우리 지프차는 지금의 서면에서 동래 방향에 있는 거제리 근처의 부대에 도착했다. 그곳 군부대에서 군인들에게 잔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군화도 닦아 주고 짬밥도 나르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보냈다. 그 당시 말하는 소위 ‘하우스보이’ 같은 그런 역할이다. 다르게 말하면 군부대 안의 마스코트 역할을 잠시 하였던 것이다.
어떤 군인 아저씨가 “어이! 찬수야!” 하면 쏜살같이 뛰어가 그 아저씨의 심부름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는 군부대 안의 분위기에 점차 익숙해졌다. 한가한 저녁 시간엔 내무반에서 여러 아저씨들이 나를 내무반 복도에 세워 놓고 놀았다. 노래도 시키고 잘했다고 박수도 치고…… 이때 나는 전시에 배운 군가 솜씨를 그 때에 아낌없이 발휘(?)했다. 원래 나는 아주 부끄럼이 많았는데 바뀐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지냈다.
한번은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미군 화장실에 갔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모두 이상했다. 양변기를 처음 본 것이다. 변은 마렵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들여다보고 두리번거리며 망설이던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양변기의 앉아야 할 곳에 고향 정난간(변소) 이용 하듯이 신발을 신은 채로 양 발을 다 올려놓고 앉았다. 그 높고 미끄러운 곳에 아슬아슬한 자세로 쭈그리고 앉아 긴장하면서 변을 보았는데,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그렇게 못 참았던 변이 자세가 이상하니 오히려 나오질 않아 고생했던 일은 지금도 집안의 양변기를 볼 때 가끔 생각나 실소를 금치 못한다.
권상사 아저씨가 아버지를 만나려면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한 달간의 군 병영내의 생활이 점차로 재미가 없어져 갔다. 후에 안 일이지만 권상사 아저씨가 거제도 포로수용소 사령부에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그 날에 맞추어 나를 데리고 갈 계획이었던 것이다. 10월 말쯤 아저씨가 나의 아버지에게 부산에 왔다는 소식과 11월 1일에 장승포 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전했다.(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