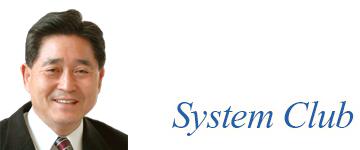내가 겪은 6.25(3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찬수 작성일10-10-23 04:59 조회2,182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24. 동해안 삼팔교
갈벌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우리 일행은 하조대 쪽으로 내려갔다. 기사문리 가까운 곳에 도달하니 늦은 오후가 되었다. 각각 바닷가 옆 빈집들을 하나씩 차지하고 쉬고 있는데 바닷가에 나갔던 한 아저씨가 뛰어 들어오면서 지금 해변 모래사장에 미역이 파도에 밀려 굴러 나오는데 굉장하다고 했다. 피난 도중 우리들은 해변에 나가 파도에 밀려오는 미역 두루마리를 보았다. 긴 백사장에 싱싱한 미역이 지천으로 굴러 나와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피난 간다는 생각도 잊고 미역을 한 아름씩 안아다 여러 차례나 빈집 마루에 쌓기 시작했다.
피난 짐 보따리 무겁다고 다리가 아파 더는 못 가겠다며 쉬던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이 미역을 한 아름씩 잘도 들어 옮겨 놓았다. 주워온 싱싱한 미역이 마당에 가득하고 집집마다 툇마루에 가득히 올려져 있는데 이른 저녁을 먹고 다시 우리 일행은 짐들을 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금방 떠날 것이면 그대로 바닷가 모래사장에 뒹굴게 내버려두지 왜 저렇게 피난하느라 힘도 들 터인데 남의 빈집에 쌓아놓아 썩게 했던가를 나는 지금도 그때의 어른들과 우리들의 미역 욕심에 대한 추억이 지워지지 않는다.
전쟁 통 피난길 시절엔 웃어야 할지 어쩐지도 모를 일들이 많기도 하였다. 밤이 어두워서 길가 빈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런데 짐 보따리를 지고 먼저 내려간 피난길 사람들이 집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해 먹고 떠나가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불을 지펴 밥을 해먹고 떠나간 다음 우리가 들이닥친 것이다. 우리가 들러 밥을 해 먹을 땐 빈 집 방구들이 사뭇 난로처럼 뜨끈하여
동해 삼팔교
이튿날, 우리들은 인구의 삼팔교에 도달했다(지금의 38선 휴게소가 있는 앞길 오른쪽). 할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찬수야! 이 다리를 봐라!”
하였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그 다리를 지나는데 할머니가 이 다리를 밟아 없애야 한다면서 할머니께서 무거운 피난 짐을 진 채로 발을 높이 쳐들더니,
우리가 머물렀던 초당 옛 기와집 터
하면서 일본 스모 선수들이 다리를 번쩍 드는 동작처럼 삼팔교를 냅다 밟았다. 나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하여서 나도 그렇게 했다.
“에이! 이놈의 원쑤의 다리! 에이! 이놈의 38선 원쑤의 다리!”
1951년 늦봄 11살짜리 까까머리 어린 내가 할머니를 따라 통일을 외치며 지나간 그 곳이다. 지금도 인구의 삼팔교를 지나칠 때면 피난 내려가면서 할머니와 밟았던 그 다리를 생각한다. 이제는 나무 난간의 옛날 다리는 흔적도 없고 새로 만든 커다랗게 새로 놓은 다리만 그 위치에서 옛날처럼 변함없는 동해의 거친 파도소리를 무심하게 듣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 (계속)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삼팔교'는 중부전선의 포천에도 있읍니다. 춘천 북방 에도 삼팔교가 있고요. 38선에 그어져진 교량이니깐 훨씬 더 많았을 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