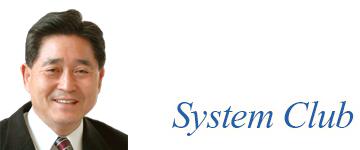내가 겪은 6.25(3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찬수 작성일10-10-25 01:02 조회2,047회 댓글2건관련링크
본문
(2). 경포대에서의 한여름
할머니는 그 댁에서 작은댁 할머니와 주인집 삼베 일을 해 주었다. 밤낮으로 삼베를 삶아 껍질을 베끼고 베낀 껍질을 가느다랗게 찢어 무릎을 세우고 실과 실을 오른쪽 무릎을 세운 맨살 위에 대고 비벼 잇는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그 이은 것을 실타래를 만들어 방안 구들에 쌓아 놓고 그 위에 두터운 덮개를 덮고 아궁이에 불을 떼어 뜨끈뜨끈하게 익히는 등 삼베가 나오기까지의 그 많은 과정을 할머니 혼자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나는 할머니가 삼베일 하는 것을 곁눈질로 보는 둥 마는 둥 하였고 피난 온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경포호에 나가곤 했다. 호숫가 바닥에서 잡은 조개를 빈 깡통에 넣고 불을 지펴 끓인 다음 벌어진 조개 속에서 조갯살을 빼먹기도 하고 얕은 물가에서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하며 평화롭게 놀았다. 그때 인상적인 것은 왕골 같은 자리를 만드는 줄기가 굵은 부드러운 풀이 있었다. 우리들의 키보다 두 길이나 길었는데 경포 호 주변을 돌아 가득히 자랐고 노 저어오는 작은 배가 그 왕골 숲에서 미끄러지듯 나왔다. 아주 평화로운 경포호수였다.
내가 내 또래의 아재, 형제들과 같이 초당에서 경포대 호수 가로 놀이 나갈 때에 기억되는 일 한 가지가 생각난다. 우리가 경포 호수에 가까워질 무렵 금강송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나무숲을 지나려면 웬 낡은 커다란 기와집이 오솔길 오른쪽에 보이는데 보기에도 으스스했다. 그곳에선 밤낮없이 귀신이 나오곤 해서 살금살금 걸어서 지나가야 된다고 했다.
우리는 낡은 기와집 근처를 지나칠 때면 겁을 잔뜩 집어먹은 얼굴로 신발을 벗어 양손에 들고 발뒤꿈치를 들고선 맨발로 소리 없이 지나가곤 했다. 요즈음 그곳을 지나다 보니 그 낡고 거미줄이 가득히 얽힌 흉흉한 옛날 기와집은 바로 조선조 중엽 이후의 여류 시조시인 허난설헌의 집이라 했다. 허난설헌은 소설《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이다.
멀리 북서쪽으로 경포대가 그림같이 우뚝하게 건너다 보였다. 지금의 경포대 해수욕장 쪽은 물이 깊고 파도가 세차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어른들이 신신당부를 했다. 아직 양양 일대에서는 우리 국군이 치열한 전투 끝에 양양을 재탈환하고 5월 말엔 간성 쪽을 넘어 고성, 금강산 쪽으로 진군한다 했다.
하루는 할머니를 따라 강릉시장 구경을 나갔다. 촌에서만 자란 나는 커다란 도시의 시장 구경을 처음 한 것이다. 넓은 길에 마차가 철거덕거리고 지나가는 것도 볼 만하였고 길 양옆에 오가는 시장 사람 행렬이 볼 만하였다.
할머니는 주인집에서 받은 돈으로 나에게 검정 고무신 한 켤레를 사주었다. 나는 그 고무신이 너무도 소중해 신지도 않고 한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새 고무신은 들고만 다녔다. 할머니가 저자거리 한구석으로 가더니 점을 보는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부모님 생년월일과 어린 두 여동생 생년월일을 대며 원산에서 난리를 겪는 가족의 생사를 잘 봐 달라고 하였다.
한참 눈을 감고 손가락을 꼽던 점쟁이 영감이 가족들은 모두 살아있다고 하면서 원산 북쪽으로 피신해 갔다고 했다. 그리고 통일이 언제 되겠는가 하고 할머니가 물으니 “한 내후년엔 반드시 통일이 된다”라고 쉽게 말했다. 그 할아버지 말대로라면 지금부터 54년 전에 벌써 통일이 되었다는 얘기다. 허무맹랑한 일이다. 다른 한곳에 들렀는데 이번엔 여자 점쟁이가 점을 본다 하여 할머니가 또 복채를 내고 점을 부탁하니 그 무당 같은 여자가 손바닥과 손가락을 묘하게 비틀더니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부모님은 살아있는데 두 어린 여동생은 이미 죽었다고 하였다. 할머니는 하도 답답하여 점을 본 것인데 안 본 것만 같지 못한 셈이 되었다. 나의 할머니는 평생 점이라는 것을 믿지도 점쟁이를 찾지도 않는 분인데 난리 통엔 그러하였다.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주인집 할아버지의 손자가 있었는데 나보다 한 살 많았다. 전쟁 통이었는데도 내가 보기에도 얼굴이 뽀얗게 귀티 나는 아이였다. 양반집 몇 대 독자라 하였다. 그런데 그 댁 어른들이 너무 오냐 오냐 하고 키워서인지 집안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우리 피난민을 깔보기가 내 어린 눈에도 대단하였다.
우리 또래인데 밥투정을 하면 그 집 할머니가 밥그릇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허연 이밥을 먹이는 걸 여러 번 보았다. 특히 그런 그가 나를 구박하면서 호령호령하는데 못 견딜 정도였다. 그러나 어찌 하랴, 남의 집에 피신 와서 어른들도 일을 해 주면서 참고 견디는데 나라고 불편하다고 대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그저 그 애가 나를 구박을 주는 대로 참고 다 받았다. 무척 아니꼽고 분했다.
한 달을 훨씬 넘긴 어느 날, 할머니는 주인집에 감사를 드리고 고향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였다. 주인집 어른과 아주머니는 우리를 가지 못하도록 극구 말리면서 지금 난리가 끝나지 않고 양양은 아직 불바다인데 어떻게 가려느냐고 펄쩍 뛰었다. 그 사이 주인집 식구들과 내 할머니, 이모할머니 댁, 그리고 작은집 할머니 등 피난 온 우리들과는 정이 들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 할머니는 베틀에 올라 나머지 베를 마저 짜 주고 고향 쪽으로는 싸움이 멈췄다는 소식만 믿고 주인집과 작별했다. 7월 들어 한참 더울 때 큰 길을 따라 숨어 내려올 때와는 전혀 다르게 탄탄대로로 고향 길에 올랐다. 고향집엘 간다니까 어찌나 좋던지…(계속)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화곡님!!!
매일 열심히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헌데 원고료는 안드려도 될까요????
김찬수님의 댓글
김찬수 작성일심심도사님 감사합니다. 제 글은 명문장가의 글이 아니기에 원고료를 염두에 둘정도의 솜씨있는 글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6.25 당시 저의 실제 경험한 체험기이기 때문에 젊은 이들에게 알려줄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곧 우리의 주적을 알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관이 내포된 내용의 글이기 때 문이라고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