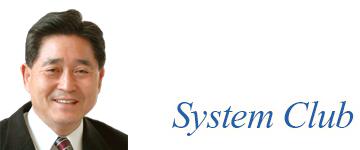내가 겪은 6.25(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찬수 작성일10-10-05 04:51 조회2,394회 댓글1건관련링크
본문
9. 양양 군청 철수 이동
6ㆍ25, 그 해 여름방학 때의 일이다. 한번은 내 또래 동네 친구들과 노는데 두세 살 많은 형들 몇이서 우리들 보고 따라오라고 했다. 우리 동네 윗 개울 마을이 있었는데 우리 친척 먼 집안 종대 아저씨(아저씨는 귀가 어두워 고생하다가 작년 2006년 여름에 타계하였음)가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었다.
멋도 모르고 따라갔는데 그 형들이 과수원 쪽으로 데리고 가더니만 우리 보고 개울가에서 망을 보라고 하고선 복숭아 서리를 하러 울타리 밑을 걷어 올리고 기어들어가는 것이었다.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몰래 따는 것을 처음 보는 나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망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개울가 커다란 돌 바위 뒤에 숨어 오금도 못 펴고 납죽 엎드려 있는데 용감한(?) 개구쟁이 형들이 훌떡 벗어젖힌 윗도리에다 복숭아를 수북이 따왔다. 나도 한 개를 주어 받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재미있어 하면서 잘도 먹었다. 하지만 나는 아까보다 가슴이 더 뛰어 한입 물어 보았을까? 뒤로 도저히 먹지를 못하고 그저 얼이 빠진 채로 멍청히 들고만 있었다.
모진 훈련(?)을 해보지 못한 결과라고나 할까?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나는 그 복숭아를 논 한가운데 팔매질을 해 멀리 던져 버렸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복숭아 맛이 자꾸 생각이 났다. ‘그냥 가지고 올걸, 아니지 던져 버리기를 잘했어.’ 하고 뒤죽박죽 생각을 하다가 정면 돌파를 하자는 생각이 번쩍 났다. 밖에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할머니 몰래 윗방의 쌀독에서 보리쌀 세 사발(지금에 생각하면 너무나 작은 분량이었다) 가량을 자루에 넣고 큰 길 따라 위 개울 종대 아저씨 댁으로 한참 올라갔다.
마당 문을 들어서서
“아저씨!”
하고 부르니 마침 마당에서 일하던 아저씨가,
“찬수 네가 웬일이냐?”
하고 물었다. 나는 아저씨에게,
“아저씨, 제가 복숭아가 먹고 싶어 왔는데 이 보리쌀과 복숭아를 바꾸어 주세요.”
하고 말했다. 세상에 나서 나는 처음으로 흥정(?)을 해본 셈이다. 한참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저씨가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얘, 찬수야, 너 마침 잘 왔다.”
하더니만 보리쌀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주렁주렁 달린 복숭아나무 밑으로 데리고 가서 자루에 수복하게 담아 주었다. 쉽게 메고 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고 나서는
“원산에 간 네 아버지가 고향에 온 이듬해에 우리 집 복숭아나무 전지를 잘 해주어서 이렇게 열매가 잘 달리는데 한 번도 은혜를 못 갚았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네가 왔구나.”
하면서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했다. 내 생각에 한 너 댓개 정도이거니 했는데……. 보리쌀은 그대로 자루에 두고…….
나는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어안이 벙벙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꾸벅 하고는 그냥 부자 된 기분으로 복숭아가 들어있는 자루를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아직 밭에 일하러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큰 고민에 빠졌다. 할머니 몰래 보리쌀을 퍼낸 것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평소에 나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제일 나쁜 사람이니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기억났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가르치는 말을 너무나 잘 이행하는 순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나도 그러하였으리라.
저녁에 돌아온 할머니에게 나는 숨김없이 낮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다 말했다. 형들이 남의 집 복숭아를 몰래 따먹으러 가는데 따라갔다가 일어난 일과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이러이러 했노라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초지종을 다 말하고는 “그랬더니 이렇게 복상(복숭아)을 많이 주시대요.” 했다. 다 듣고 난 할머니가 기특하다는 표정으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더니만 꼭 껴안아 주었다. 복숭아를 보며 할머니는 원산의 아버지 생각을 또 한 번 하였으리라.
그 당시 예로부터 내려오는 농촌 풍습은 청소년들의 경미한 서리인 경우에는 알고도 모르는 척해 주는 분위기가 있었다. 주인이 때에 따라 그 광경을 보았을 때에도 멀리서 헛기침하며 “어험! 이놈들!” 하면서 들릴 듯 말 듯 소리쳐 그냥 도망가게 내버려두기도 하던 때였다. 적당히 묵인하는 관습, 즉 일종의 교육적인 배려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어린 청소년들이 바른 교육을 받고 그런 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는 사회 풍습이라고나 할까? 어떤 면에서는 미풍양속이라 볼 수도 있는데 요즈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 이후 할머니는 손자 자랑하실 일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가끔 그 복숭아 얘기를 꺼냈다. “얘가 그런 애라우!” 하면서……. 할머니가 80세가 넘었고 내가 교직에 있으면서 30이 넘어 장가들어 아이를 둔 뒤에도 이웃에게 그렇게 말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저 어색하기만 했다.
그 해 8월초, 남쪽 읍내에 있는 양양군청의 직원들이 북쪽 우리 마을로 피해 와서 동네 집집마다 자리 잡고 군청 사무를 보았다. 갑자기 군청이 도심지로부터 시골구석으로 피신해 숨는 꼴이니 마을 전체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남조선 해방시키러 나갔다는 이야기도 별로 신이 나지 않은 것 같았다. 군청에서 동네 집 뒤 대나무밭 산비탈에 여기저기 방공호를 파는데 양양 철광산에서 쓰는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와서 터뜨리면서 굴을 팠다. 지금도 내 고향 마을 집 뒷산엔 방공굴이 여럿 그대로 남아 있다.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려고 길게 이어 놓은 남포 심지들이 나중에 국군이 주둔했을 때도 남아 있었다.
이때 나는 고금(학질)이 걸려 무진 고생을 했다. 하루는 열이 나면서 부쩍 아팠다가 다음날엔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멀쩡했다. 군청 직원들이 금계랍(학질약)이란 노란 알약을 줬는데 약을 먹고 나서도 쉽게 낫지를 않았다. 참으로 그 고통이 말이 아니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약을 많이 먹으면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두 알이 정량인 알약을 네다섯 알이나 한꺼번에 먹었다. 그날 밤 밤새도록 꿈속에서 캄캄한 낭떠러지에서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다 올라가고, 떨어지다 올라가는 악몽에 시달리다가 거의 죽기에 이르렀고, 할머니는 늘어져서 정신을 잃은 나를 안고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한다. 얼마 뒤 다행히 회복되었지만 후일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전문가의 지시 없이 약을 오남용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경험으로 알았다.
우리들은 전쟁이 한참 치열했던 10월 이후와 그 이듬해 1ㆍ4후퇴 뒤에 피난 갔다 돌아온 여름철엔 그 광산용 폭약에 잇는 줄을 개울에 가지고 나가서 흔하게 널려있는 장총이나 기관총 탄피에서 총알을 빼고 화약을 그대로 둔 채 다이너마이트로 이어지는 심지를 화약이 있는 곳에 들이밀어 넣고는 돌로 탄피 입구를 꼭꼭 우그러트려서 개울 큰 바위 밑에 집어넣고서 멀리서 심지에 불을 붙여 그 탄피가 터지게 하여 큰 바위가 들썩할 정도였고 물위로 둥둥 뜬 고기를 건지는 놀이를 하였으니 실로 위험천만한 놀이였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폭약을 터뜨리고, 고기 잡는 재미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몰랐다. 여름방학이 다 지날 무렵, 어른들이 서로들 삼삼오오 모여서 쑤군덕거렸는데 그 때부터 우리들도 학교를 나오지 말라고 휴교령을 내려 학교도 쉬고 좋아라고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개울가에서 가재 잡고 멱 감으면서 놀기만 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무렵이 38선 이남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일성의 불법남침으로 인하여 갑자기 터진 전쟁때문에 사람목숨이 벌레보다 못하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처참하게 죽어갔다는 사실이다.
여기저기서 이상한 일만 자꾸 있었고, 동네 인민위원장, 여맹위원장 등 새빨간 사람들이 성난 사람처럼 긴장한 안색으로 다녔다.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고 우리 집안 친척 어른들과 나이 든 형들은 마음속으로 무언가 좋은 것을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였다.(계속)
댓글목록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노오란 알약!!!
금계랍(겡기랍)
이거 먹어보신 분들은 진정한 어른들 이십니다
그 쓰디쓴 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