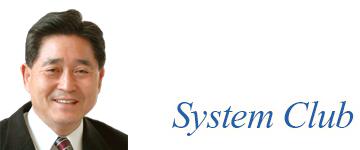내가 겪은 6.25(4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찬수 작성일10-10-31 05:22 조회2,58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 전쟁중 거제도에서 온 아버지의 편지.
어느 날 저녁, 동네 어른들이 마을 사람들을 전부 모이라고 했다. 구호물자가 왔으니 집집마다 배당이 있어 타 가라는 것이다. 할머니와 나는 바로 옆집 안기혁 아저씨 댁엘 갔는데 구호물자라는 것이 옷가지들이었다. 그런데 그 옷들이 너무나 커서 체격이 왜소한 시골사람들이 입을 수가 없었다. 미국사람들이 전쟁이 난 우리나라에 원조물자로 모아서 보낸 것들이었다. 그렇지만 옷가지이니까 아주머니들이 서로 골라가면서 이 집 저 집 배당을 주었다.
그런데 묘한 것은 할머니에게는 이상한 옷이 배당된 것이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고르는데 뒷전에 앉아 처분만 기다리는 나의 할머니에게 배당 준 옷이 아무도 가지려 들지 않는,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이상한 물건이었다. 흡사 머리에 쓰는 모자 같다고 생각했는데, 모자 두 개가 이어져 있었다. 다른 쓸모 있는 옷가지들은 모두 동네 젊은 아주머니들이 서둘러서 차지했고 그 물건은 밀리다 밀리다 개밥의 도토리가 되어 나의 할머니 몫이 되었다.
그리고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의 할머니에게 배당준 것이 하도 이상하고 어디다 쓰는 옷인지도 몰라 어리둥절해 가면서 의견을 모았는데, 여자들 가슴을 싸매는 옷이라 하였다. 그러고서는 이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입어보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고는 집안이 떠나갈 듯이 깔깔대고 웃었다.
내 할머니에게 배당된 아리송한 옷은 여자들이 입는 브래지어였던 것이다. 나는 할머니가 들고 있는 그 옷을 들고서 보니 엎어 놓으면 흡사 산소의 커다란 무덤 봉우리 두기처럼 보였다. 아주머니들이 방바닥에 엎어 놓은 걸 보니 너무도 큰 것이어서 앙상한 나의 할머니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할머니 품속에서 자랐었고 열두 살 될 때 까지도 갈비뼈만 집히는 앙상한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던 나였기에 나의 할머니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옷이라 생각했다. 미국에서도 아주 몸집이 큰 여자가 보내 준 가슴 싸매기 옷이었던 것 같다. 필요한 옷가지 나누기가 다 끝난 뒤 할머니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
“내 같으면 손수건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으련만 이런 것을 어디에다 쓰랴! 나는 필요 없으니 너 옥화나 가져라.”
하면서 이웃집 시집 안 간 누나에게 주니 그 누나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부끄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8월 말쯤인가 할머니와 내가 밭에 갔다가 돌아오니 동네사람들이 야단법석이었다. 사단 사령부에서 김상사라는 군인이 이 마을에 찬수란 아이와 그 할머니가 사느냐고 묻고 갔다고 야단들이었다. 할머니는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서 한참 궁금해 있었다.
그런 뒤 9월 20일쯤 우리 집 앞에 군인 지프차가 와 서더니만 찬수란 아이가 있느냐고 하면서, 있으면 잠깐 사령부 헌병대 권상사가 만나보고 싶어 하니 이 차에 타고 가자고 하였다. 할머니는 영문도 몰라 의아해 하였고 나도 겁이 덜컥 나서 망설이기만 하였다.
그 서씨라 하는 일등중사 아저씨(후일 거제도에서 다시 만났는데 연초면 한내리라는 곳이 고향이었다)가 웃는 얼굴로 나에게 이상한 경상도 말로,
“야야―! 니, 가 보먼 알긋지만 디―게 좋은 일이 있을 끼다. 마 퍼뜩 가자!”
하지 않는가. 그제야 할머니는 나를 보고 차타고 갔다 오라 하였다.
난데없이 나는 생전 처음 지프차를 타고 군 사령부 앞에 지금의 나의 6대조 할아버지 묘소 위쪽에 위치한 땅 속 진지 벙커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 안에서 얼굴이 둥글둥글하면서 아주 잘 생긴 체격이 큰 헌병상사가 허리에 권총을 차고 나오면서,
“네가 찬수냐?”
하고 물었다. 그리고는,
“내가 권오홍이다!”
하고 소개했다. 이때부터 권오홍(權五弘) 상사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 되었다. 내가 얼떨떨하면서,
“네!”
하고 대답하니 그 헌병상사가 갑자기 나를 와락 껴안아 들어 올리면서,
“찬수야! 네가 찬수로구나!”
하면서 몇 바퀴 돌더니만 나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건네주며 뜯어보라고 하였다. 어리둥절했지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데 호기심이 일어나 나는 편지의 겉봉투 글씨를 찬찬히 보았다. 눈에 익은 글씨였다.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립고 보고 싶은 내 아버지의 독특하고 다정한 글씨였던 것이다.
“찬수야! 네 아버지가 지금 경상도 거제도 연초중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
하고 말했다. 경상도? 거지도(거제도)? 교장? 나의 머리 속은 갑자기 종잡을 수 없게 혼란스러워졌고 또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북쪽 원산에 있는 아버지의 편지를 이 군인들이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남쪽의 경상남도 거제도에서 가지고 왔다는 말인가?
겉봉투에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중복리 찬수 받아 보아라.’라고 커다랗게 쓰여 있었고, 뒷면엔 ‘경상남도 거제군 연초면 하청중학교 연초 분교장 김종권 씀’이라고 씌어 있었다. 이때부터 나는 흥분하여 한참동안 내 정신이 아니었다. 아저씨들을 두리번거리면서 보다가 아버지 편지를 들어 겉봉투를 보다가…….
한참 이러고 있는데 권상사 아저씨가 재미있다는 듯이,
“찬수야! 어서 편지를 펼쳐 보아라.”
하였다. 나는 그래도 너무 좋고 흥분하여 꿈인지 생시인지를 구분 못하여 어쩔 줄 몰랐다. 할머니에게 당장 달려가고 싶었다. 폭격으로 원산에서 잘못된 줄로 알고 있는 나에게 아버지의 편지가 친필로 온 것이다! 아버지가 살아 있다니! 그때의 감격스러움은 아직도 생생하다.
여러 아저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나는 아버지의 편지 겉봉투를 뜯어보았다. 여러 장이 겹쳐 있는 아버지 편지를 꺼내어 펴 보니 그립고 보고 싶은 아버지의 글씨 모양이 와락 내 눈으로 들어왔다. 보고 싶고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와 두 귀여운 여동생이 모두 원산이 폭격을 받아 재가 된 가운데에서 살아났고 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하는 저 머나먼 남쪽 끝에 가 있다 하니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편지지 다섯 장의 앞뒷면 가득히 오른쪽으로부터 내려 쓰신 종서였는데 나는 단숨에 다 읽었다.
찬수 받아 보아라!
찬수야! 할머님 모시고 잘 있었느냐? 이 애비를 용서해 다오. 네가 할머님을 모시고 이 참혹한 전쟁 속에서 살아 있다는 소식 들으니 이 기쁨을 어찌 표현하랴! 장하고 장하다.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된 편지는 잉크로 씌어진 글인데 얼룩진 흔적으로 말라 있었다. 당신의 오늘이 있게 하신 어머님과 어린 아들인 나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는 처음부터 눈물을 흘리며 썼음을 대번에 알 수 있었다.(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