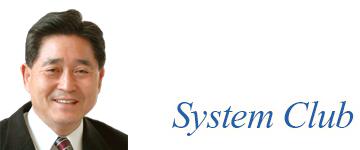내가 겪은 6.25(24)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찬수 작성일10-10-14 07:48 조회2,85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7. 눈이 많이 온 해 1ㆍ4 후퇴
1951년 1월 4일 다시 말하지만 그 유명한 1ㆍ4 후퇴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인민위원장을 패버린 동네 아저씨들은 모두 남쪽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이틀 뒤 인민군이 우리 동네에 또 들어왔다. 그해 설날은 눈이 아주 많이 왔지만 명절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원래 동해안 지방 우리 고향은 음력설 전후하여 보름이 지날 때까지 함박눈이 많이 와 쌓이는 곳이다. 설악산에서 동해안 벌판까지 흰 눈으로 가득 덮여 그 눈경치가 아주 볼 만한데 전쟁이 한창인 그 해에도 어김없이 그러했던 것 같다.
‘쌕쌕이’가 연신 하늘에 굉음을 내며 수시로 날아다니고 여기저기에 폭탄을 떨어뜨려, 한번 터졌다 하면 천지가 진동했다. 그 때마다 우리
눈이 많이 온 어느 날, 개울말 머일 이모할머니 댁에서 머일 이모할아버지와 나는 짚신을 삼고 있었다. 머일 이모할아버지는 짚신 잘 삼기로 고을 안에서 소문나신 분이다. 할아버지에게서 짚신을 잘 삼는 방법을 정신 차려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허리에 새끼로 허리띠를 두르고 배꼽께 줄을 이어 양쪽 엄지발가락으로 집신에 들어갈 가느다란 새끼줄을 접어 늘이고 짚신을 반 이상을 삼고 있는데 갑자기 양양 읍내 쪽 하늘에서 ‘방구 비행기’ 소리가 “뿌―웅” 하고 났다.
방구 비행기가 떴다 하면 2, 3분 뒤에 어김없이 제트기가 날아오게 되어 있다. 머일 이모할머니 댁 온 식구들은 모두 두터운 솜이불을 뒤집어쓰고 엎드려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불이란 이불은 모조리 우리들 머리꼭대기에 덮어 놓았다. 그 바람에 방바닥에 납죽 엎드려 있던 우리들은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숨을 쉬지 못할 지경이 되었고 이불 속에서 공기를 쐬려고 발버둥을 치곤 했다.
그런데 나는 불편하더라도 그곳에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겁도 나고 갑자기 할머니 얼굴이 떠올라 이모할아버지가 붙드는 것도 듣지 않고 바깥으로 뛰어 나갔다. 할머니가 있는 양지마을 방공호로 가고자 함이었다. 어느 결에 날아왔는지 양양 하늘 꼭대기에는 여러 대의 ‘쌕쌕이’들이 날아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무서운 기총사격을 하면서 공습을 하는 중이었다.
개울말 동네는 낮은 쪽이어서 괜찮았는데 나는 언덕에 올라 양쪽으로 논만 있는 달구지길 허허벌판을 죽어라고 뛰어가는데 항공에서 보면 노출이 다 된 셈이어서 금세 발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양양 읍내에서 ‘쌕쌕이’ 몇 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공습하는 소리고 뭐고 다 아랑곳하지 않고 죽어라고 할머니 있는 방공호 쪽 산으로만 들이뛰면서 치달았다.
방공호 쪽에 다다르니 내가 벌판에서 혼자 뛰어 들어오는 모습을 아슬아슬하게 지켜보던 동네 어른들이 들어오기 무섭게 야단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는 혼이 많이 났다.
“그곳에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지 저놈의 자식이 동네사람 다 죽이려고 한다.” 하고 야단을 쳤는데 특히 우리 동네 규율 담당격인 종렬 아저씨가,
“너 이놈! 그러다가 기총사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고 호통을 칠 때는 총소리 들을 때보다 더 무서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내가 벌판을 뛰어 들어오는 모습에 방공호에 숨어서 밖을 내려다보시던 동네 어른들이 더 놀랬던 것이다. 할머니는 나를 꼭 껴안으며 종렬 아저씨에게,
“그만 하시게나! 아이가 너무 놀라고 있지 않나! 무사했으면 됐지!” 하였다.
한숨을 돌리고 난 뒤 나는 내 허리춤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짚신 삼다가 그대로 들고 뛰어 반쯤 넘게 삼던 짚신이 아랫배 아래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그 이후 우리 동네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나 인민군대가 주둔해서 흰 가운을 길게 하여 등 뒤에 매달고 다녔는데 비행기만 떴다 하면 그 자리에 흰 가운을 뒤집어쓰고 납죽 엎드렸을 땐 눈인지 사람인지를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때 어린 나는 하마터면 인민군에 총살을 당할 뻔하였던 일도 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어디 가고 작은집 할머니가 나와 함께 집에 있었는데 마침 우리 집에 인민군 두 명이 묵고 있었다. 작은댁 할머니는 인민군으로 입대한 두 아들 종각, 종숙 아저씨 이야기를 하면서 소식이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나를 가리키면서,
“얘가 국방군이 올라왔을 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는 내 앞에서 큰 소리로 빨갱이들은 모두 다 죽여야 돼! 하면서 여러 번 말하는 바람에 나는 섭섭해서 견디기 어려웠다.”
하고 말을 했다. 졸린 듯 가만히 듣고 있던 인민군 두 사람은 작은댁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종전의 눈빛과는 완전히 다른 독이 바짝 오른 사나운 눈초리로 나를 째려보았다. 그리고는 방구석에 세워 놓은 따발총을 잽싸게 잡더니만 작은댁 할머니를 보고 나를 가리키면서,
“야가 할머니와 어드렇게 됩네까?”
하고 물었다. 이 기색을 살핀 작은댁 할머니도 심상치 않았던지,
“얘가 바로 내 손지(손자)라우!” 하고 대답했다. 그제야 인민군이 나를 독하게 노려보다가 다시 따발총을 벽에 세우더니 나를 보고,
“앞으로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총살이야!” 하였다.
나는 갑자기 총살한다는 말에 너무 놀라 숨도 잘 쉬지 못하면서 온몸이 오그라드는 느낌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때 따발총을 들었던 인민군의 눈초리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듯하다. 작은댁 할머니가 말 한번만 더 잘못했으면 나는 지금 이 글을 쓸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어른이고 아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말 한 마디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였다.
2월 중순경, 어른들은, 공습 후 양양 읍내까지 국방군이 들어왔는데 다시 강릉 쪽으로 후퇴했다고 조용히 말했다. 3월 말 가까이까지 우리 마을엔 인민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두워진 뒤 갑자기 동네에 주둔하던 인민군들이 모두 철수 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동네에서 제일 친한 친구이자 친척 집안의 나보다 한 살 아래 동생인 중수와 개울말 인민재판 때 다리를 크게 다친 아저씨 댁에서 새끼를 꼬고 있었다.
사람 소리가 웅성거려 문틈으로 밖을 빼꼼이 내다보니 논밭 위로 하얗게 덮인 눈에 달빛이 비쳐 인민군들이 동네 소들을 모두 몰고 군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소금재 고개께로 넘어가는 행렬이 보였다. 소를 급히 몰고 가다가 아저씨네 앞길 아래 논 쪽 비탈에 쌓인 눈에 미끄러져 내리 굴러 아우성 소리가 요란히 나기도 했다. 그 이튿날 어른들이 말씀하는데 그 동안 동네에 남아 있던 빨갱이와 빨갱이 비슷한 자들은 몽땅 그 인민군대와 같이 북으로 다 넘어갔다고 했다.
이때 소금재 인민군들이 눈이 덮인 고개를 넘어간 그날 이후 윗복골 마을과 우리 마을 그리고 회룡리 일대엔 또 슬픔의 이야기가 마을마다 퍼졌다. 인민군들이 후퇴하며 마을을 떠날 때 마을마다 남아 있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 중 힘깨나 쓴다는 남자들은 모두 불러 앞세우고 짐을 지고 가게 했다는 것이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인민군 총부리 위협에 못 이겨 짐을 지고 갔는데 그 일행들이 넘은들을 지나 벼락 바위께 쌍천을 넘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캄캄한 밤 뿌연 눈길에서 짐을 내려놓고 쉬는 동안 일행 중 이북으로 가기 싫은 사람들이 서로 눈치 약속으로 짜고 있다가 출발하고 얼마 있지 않아 중도문으로 들어서기 전 인민군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갑자기 짐을 벗어 던지고 다시 벼락바위 쪽 소금재 고개께로 도망을 치기 시작하였다 한다.
한밤인데도 이 낌새를 알아차린 인민군들이 따발총과 장총을 쏘면서 도망가는 일행 뒤통수를 쫓아오는데 장잿터께로 도망한 사람들 몇은 무사하고 소금재 고갯길로 다시 넘으려 도망치던 사람들이 따쿵 총으로 드르륵 하고 쏘아대는 사격에 맞아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기진하고 공포에 젖어 아주머니 할머니들의 눈에 눈물이 다 마를 지경이었다. 나의 친구 아버지들 몇이 이때 안타깝게 희생되었다.(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