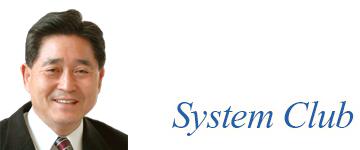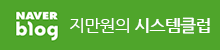내가 겪은 6.25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whagok22341 작성일10-09-22 06:18 조회2,65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 귀향(歸鄕)
나의 고향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중복리이다. 마을 뒤로는 산이 높고 수려하며, 앞으로는 푸른 동해 바다가 펼쳐져 바라다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이 시원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고장이다.
특히 늦가을이 되어 물치 장거리에서 우리 동네를 올라올 때 설악산 대청봉을 올려다 볼라치면, 마을에는 집집마다 감나무 가지에 주황색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송암산 너머 저 멀리 우뚝한 대청봉 산마루엔 눈이 하얗게 덮여 동해 바다를 장엄히 내려다 보는 듯한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낸다. 가을과 겨울이 한눈에 보이는 놓치기 아까운 장관이 연출되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곳은 나의 선조들과 부모가 태어난 곳이고 선영들이 모셔진 곳이기에 정신적인 고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1945년 해방의 기쁨을 안고 어른들을 따라 고향으로 내려와 1952년까지 8년간 살면서 끔찍했던 6ㆍ25 동란 전후의 아픈 추억만 가득한 곳일 뿐이다. 태생도 그곳이 아니고, 온전히 성장한 곳도 그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객지에서만 살았기에 많이 산 곳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서울이 고향이요, 동심이 묻혀 있는 청소년기를 기준으로 따진다면 시원하고 아름다운 항도 부산이 내 고향이고, 태생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조선조 세종대왕 때 김종서 장군이 육진을 개척 시 진영을 쳤다는 함경북도 종성군 행영면 영리가 나의 고향이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자란 내륙의 호반도시 춘천에서 36년 동안이나 행복을 간직하고 오가며 지내고 있으니 이곳 또한 내 고향이랄 수도 있겠다.
1945년 8ㆍ15 해방 이후 그 해 11월, 29세인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정리한 뒤 우리 식구를 데리고 함경북도를 떠나 고향 강원도 양양으로 내려왔다.
그때 기차에 자리가 없어서 기차 화통이 있는 맨 앞 차량 꼭대기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오는데, 거기도 사람이 빼곡히 들어차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판이었다. 게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다리를 오랫동안 깔고 앉은 것이 원인이 되어 고향에 도착한 뒤에 절뚝거리며 걸어 다녀야 했다.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으로 탄 볏짚재에 오줌을 부어 재운 것을 짓이겨 보리개떡 반죽같이 두툼하게 만들어 아픈 부위에 붙여 놓고서 붓기를 빼곤 했다. 이때 아픈 무릎께가 한동안 몹시 근질근질하고 못 견디게 따끔거렸던 생각이 난다.
함경북도에서 원산 쪽으로 내려올 때 기차가 달리다가 굴이 나타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는 기차소리 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엎드려!” 하고 외치면 화통의 맨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납죽 엎드려 가며 여러 차례 기차 굴을 빠져 나갔었다.
그러던 중에 원산 근처 덕원 역에서 승객들이 잠시 쉴 때였다. 로스께(소련군인)가 갑자기 귀중품과 사진 등 온갖 소중한 자료가 들어 있는 우리 아버지의 커다란 가방을 날치기해 도망간 일이 있었다. 이를 목격한 아버지는 도망가는 로스께를 쫓아가고 나를 업고 있던 할머니는 한참을 지나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큰 소리로 울면서,
“아범이 오지 않는걸 보니 소련군 놈이 필시 총질을 하였을 것이다. 아범이 오지 않으니 내가 살아서 뭣하랴!”하면서 기차 바퀴에 몸을 던져 죽겠다고 하던 절규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듯하다.
기차가 떠날 시간이 임박해서야 우리 집 전 재산이었던 가방을 잃어버린 채로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온 아버지와 우리 가족은 알거지 행색이 되어 고향 강현 역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나를 안고, 어머니는 8ㆍ15 해방이 지나 갓 태어난 여동생을 안고, 할머니는 아기 옷가지 몇 개 달랑 손에 들고서 다섯 식구가 지친 모습으로 집도 없는 고향 마을로 향했던 것이다.
뒷날 할머니는 이때를 떠올리면서 두고두고 말하기를,“예전에는 강현 역에서 우리 집 동네를 오갈 때는 발걸음도 가벼웠었는데, 해방되었다고 기쁜 마음으로 객지에서 고향에 가다가 덕원에서 귀한 물건 들치기 당하여 다 잃어버리고 맨주먹으로 오게 되다니……. 고향 사람들 보기에 창피했고, 10리도 못 되는 길을 초겨울에 들어서서 우리 텃밭까지 걷는데 그렇게도 멀게 느껴져 보기는 처음이었다.”라고 했다.
고향에 온 우리 가족은 택호가 ‘반재집’이라는 친척집 뒷방 하나를 빌려 살게 되었다. 38선 이북 공산 치하의 생활은 그렇게 무일푼으로 시작되었다.(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